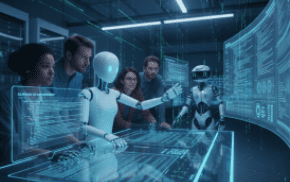돌고 돌아 결국 IT특보로 간다. " IT노동자가 천대 받는 정권" 이란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봇물이었다. 청와대의 대답은 IT특별보좌관 신설이다. 일단 모양은 우습게 됐다. 정식 직제에 포함된 것도 아닌, 뜬금 없는 특보라니.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미 IT산업에 대한 영역구분은 확실히 했다. 방통비서관도 있고 국민소통비서관도 활약중이다. 지경부를 관할하는 비서관도 어엿하다. 이런 판에 IT담당 비서관이나 수석을 만드는 것은 어색하다. 업무 중복에,옥상옥 시비를 낳을게 뻔하다.
일종의 묘수였다. 직제개편의 산도 피해가고 대통령의 IT관심도 부각하는 특보 자리를 만든 것이다. 선의의 해석은 이렇다. 그나마 홀대 받던 IT노동자들이 하소연할 가까운 창구가 생긴 것이다. 악의로 해석하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준 셈"이다. IT인들 자존심 세워달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시늉만 한 꼴이란 것이다.
일부에선 벌써 호들갑이다, 특보 하마평이 한창이다. 마치 신설되는 특보가 대한민국 IT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것 처럼 잔뜩 바람을 넣고 있다. 기대는 좋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도대체 특별보좌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파워는 제도에서 비롯된다. 아니면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제도적 파워는 '별볼일 없음 '이다. 엄연히 각 분야별 수석과 비서관이 일하고 있다. 특보는 상근직도 아니요, 청와대내에 사무실도 없다. 그렇다고 보수를 받는 자리도 아니다. 말그대로 명예직이다.
대통령 산하 정식 기구인 각종 위원회 조차 비서실과 알력을 빚는다. 특별보좌관은 정책 입안권과 집행력 어느쪽도 손에 쥔 것이 없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리에 기대를 건다. 제도적 권한이 없으니 대통령에게 확실한 자문을 하면, 대통령이 애착과 힘을 실어 주기만 하면 파워는 획득된다.
그래도 환상은 금물이다. 역대 어느 정권의 특보도 제도권력 보다 앞선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MB에게는 과학기술, 언론 등 4명의 특보가 있지만 그들이 파워는 커녕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반증은 찾기 어렵다.
기왕에 도입한 특보라면 성공하길 기원한다. 더불어 한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특보 신설이 IT인들의 사기 진작과 IT산업에 대한 MB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른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다. 실효성과 효율성의 비판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물을 꾸려볼 수도 있다.
예컨데 'IT 명예의 전당'을 세우는 일이다. 대한민국 IT는 정부가 좌지우지 하던 시대를 졸업했다. 정부의 눈치는 보겠지만 가만이 내버려둬도 제 몫 100% 이상 하는 사람들이요, 산업이다.
다른말로는 규제 철폐만 해도 신화를 계속 써내려갈 역량과 토대를 갖춘 분야라는 것이다. IT노동자들이 바라는 것도 칭찬은 언감생심, 폄훼나 말아달라는 소박한 희망이 전부이다. 그런 점에서 IT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작업은 청와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IT산업은 30여년의 세월이지만 전자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60여년의 연륜을 자랑한다. 그 역사는 곧 신화였다. 이쯤이면 명예의 전당 하나 쯤은 있을 만 하다. 해마다 이곳에 헌정되고 헌액되는 인물및 상품이 선정되는 광경을 상상하면 즐겁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인 올바른 가치의 창출과 계승 단절도 IT쪽에서 극복해 보자. 사기와 자존심의 결정체, IT명예의 전당은 멋진 일이다. 해외에선 분야별로 수많은 명예의 전당이 존재한다. 금융에 항공화물에, 즐비하다.
심지어 카네기멜론대학은 로봇 명예의전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오르는 로봇들은 세계적인 관심사요, 언론의 화제로 등장한다. 우리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있고 협단체 차원의 전당도 많다.
얼마전 미국에선 집적회로(IC) 탄생 50주년을 맞아 각가지 행사가 열렸다. 때맞춰 미국 특허청 산하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15명이 발표됐다. 한국인 과학자도 눈 길을 끌었다. 벨 연구소 재직시 최초 상용화 IC인 MOS-FET를 개발한 고 강대원 박사가 포함됐다. 여기에 고든 무어, 앤디 글로브 등 인텔 창업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미 특허청의 발명 명예의전당에는 지금까지 380명이 헌정됐다. 토마스 에디슨부터 전화의 아버지 벨, 슈퍼컴 개발자 에이무어 크레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튼 서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이 꼽혔다.
한국의 IT역사는 단편적이다. 수많은 스타 기업인과 개발자들, 정책 입안자들이 신화를 만들었지만 '역사'는 파편화, 개별화 되었다. 각 기업의 사사 속에 잠들어 있다. 정책관료들의 업적은 아예 기억 조차 없다.
한국 최초의 TV, 컴퓨터, 교환기 등등의 실물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허락치 않는다. 언론 조차 당일의 흔적만을 기록할 뿐이다.
오명, 정홍식의 관료군에서, 강진구, 이헌조, 윤종룡, 이기태, 황창규를 비롯한 글로벌 스타 경영인들, 서정욱 등 관료와 기업을 오간 전문가집단, D램과 전전자교환기,CDMA를 개발하고 개통한 '이름 없는 진정한 영웅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 보다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자산은 없다. 기록은 가치로 진화해야 의미를 얻는다.
관련기사
- 이 대통령 “청와대에 IT전담관 두겠다”2009.05.14
- [이택칼럼]"우리의 미래에 IT는 없다"2009.05.14
- 한국 IT산업 경쟁력은「세계 3위」2009.05.14
- IT강국, 새성장엔진 달아라2009.05.14
IT특보 도입하고 파열음만 발생한다면 아니한만 못하다. IT인들의 사기와 자존심은 어설픈 자리 나누기가 아닌 명예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 정권이 IT에 대한 철학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명예의 전당을 만들라. 정부가 아이디어 내고 민간이 함께 추진하면 된다.
우리도 'IT 명예의 전당' 가질 때가 됐다. 이제는 '신화'를 온전한 '역사'로 전이시켜야할 시점이다. 특보 도입한다는 이명박 정부이지만 할 일은 아직도 '태산'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