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실시간 채널과 다시보기(VOD) 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합작플랫폼을 설립하고 공동 N스크린 서비스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MBC와 SBS는 내달 초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7월 중 공동 N스크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KBS는 지분 참여는 하지 않는 대신 실시간 채널과 다시보기(VOD)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가 유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사가 서비스 중인 ‘푹(pooq)’과 ‘고릴라’는 통합 플랫폼 개시 시점까지 유지되고 이후 서비스 지속 여부는 각사가 결정할 계획이다. 합작 플랫폼이 생기면 푹과 고릴라는 N스크린 통합 플랫폼으로 합쳐지면서 사실상 유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N스크린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되고 PC에서 이용 가능한 사이트도 함께 오픈한다. 합작사 설립 후 스마트TV 제조사 등 외부 사업자들과 제휴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상파가 N스크린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이유는 트래픽 비용 부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MBC는 N스크린 서비스 ‘푹’을 출시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 MBC와 SBS의 실시간 채널을 비롯해 계열 유료방송 채널까지 무료로 제공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지상파가 치러야 할 네트워크 비용과 콘텐츠 전송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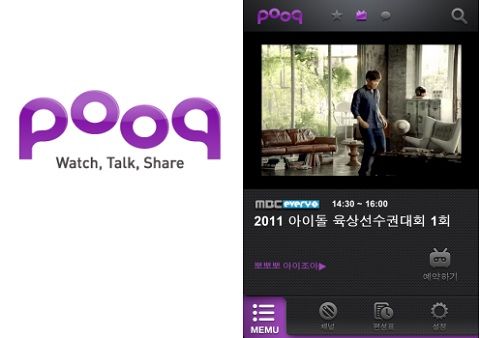
MBC 관계자는 “월 1억원 이상을 네트워크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이를 메꿀 방법이 현재로썬 없어 적자상태”라면서 “시행초기 적자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MBC 같은 경우 푹에 자체 광고를 탑재해왔지만 적자폭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N스크린 광고를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제살 깍아먹기’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건당 과금방식인 다시보기(VOD) 서비스도 수익 모델로 삼았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의 정책에 따라 내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고심 중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N스크린 서비스 유료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다. 유료화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지만 시청자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무료 서비스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방송사업자들과 통신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뉴미디어 대응 차원에서 우후죽순 N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섰지만 수익모델의 부재로 부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N스크린 서비스의 원조격인 CJ헬로비전 ‘티빙’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정액제 기반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유료 가입자는 미미하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호핀’과 KT의 ‘올레TV나우’, LG유플러스 ‘U+ HDTV’ 역시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서비스 모델이다.
판도라TV와 현대HCN이 함께 제공하는 ‘에브리온TV’는 채널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대신 방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MBC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도 방송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도 기존 사업자들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한류 지속의 지름길…'글로벌 N스크린'2012.01.12
- 스마트폰에서 MBC-SBS 실시간 방송 본다2012.01.12
- “스마트폰 본방사수”…지상파 ‘N스크린’ 삼국지2012.01.12
- “N스크린 서비스, 지상파가 발목”2012.01.12
국내보다 N스크린 서비스가 활성화 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유료 모델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기확보한 유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당연하게 무료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무리하게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 웹하드 등 단기 수익에 집중하면서 홀드백을 지나치게 줄여 스스로 콘텐츠 가치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콘텐츠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