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가 블록체인 관련 표준을 정비한다. 현재 용어부터 시작해 보안, 스마트계약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규격을 만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ISO는 오는 11월 경에는 스마트계약 개요와 활용방안을 정리한 기술보고서(TR)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정의해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최근에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기술설명서(TS)도 준비 중이다.
이 작업은 ISO 산하 기술위원회인 TC307이 주도하고 있다. 2016년에 만들어진 TC307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주제로 블록체인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진행한다.
국내에선 김현규 마크애니 경영관리본부 과장이 ISO TC307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분산원장에 외부데이터 올리는 주체 'DLT오라클'로 정의"
김 위원은 TC307 안에서도 스마트계약을 다루는 WG3에서 활동한다. TC307 WG3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6차 총회에서 스마트계약의 개요와 활용방안을 정리한 기술 보고서(TR)를 발행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용어 정리를 비롯해 스마트계약의 해석 방안과 구현 사례들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스마트계약을 다룰 때 자주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인 '오라클'을 정의한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로 유명한 오라클과 용어가 같아 혼동을 줄 수 있어, 블록체인 업계에서 쓰이는 '오라클'은 'DLT오라클' 또는 영어로는 일반 명사로 취급해 소문자(oracle)로 표기하기로 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DLT오라클'은 외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분산 원장에 올리는 주체를 말한다. 스마트계약을 실행하려면 분산 원장 위에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때 분산 원장 밖의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외부 데이터를 오염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게 분산 원장에 등록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주체를 'DLT오라클' 또는 'oracle'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라클은 복수로 존재해 상호 간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무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해당 문서에 들어간다.
김 위원은 "표준 문서에 그냥 오라클이라고 적었다가는 상표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한국어로 쓸 때는 회사 오라클과 더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전문가가 모여 DLT오라클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기술을 얘기해도 저마다 알아듣는 바가 다르게 되면, 일반 사용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기술을 직접 쓰거나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술적인 토의가 힘들어지게 되고, 해결방안을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용어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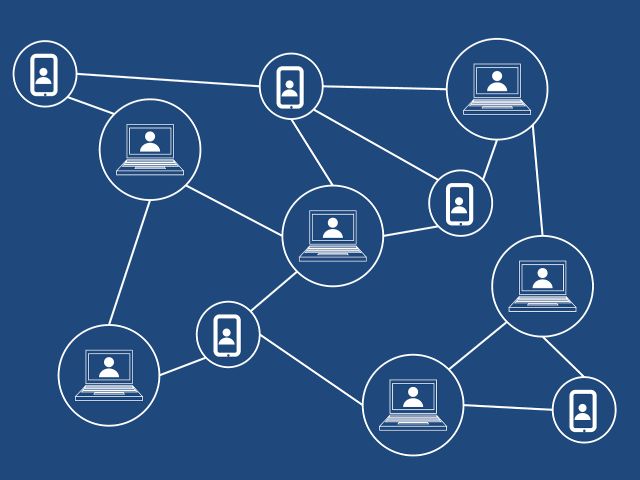
■ "표준화는 호환성 보장 도구, 기술적 혜택 누리게 해"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화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김 위원은 "기술은 항상 모두가 쓸 수 있게 만들어지진 않는다"며 "표준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적 혜택을 많이 못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표준화는 호환성을 보장해주는 도구이며, 같은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경쟁하고 누구든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T분야에서는 호환은 더욱 중요하다. 특정 업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그 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이상 다른 경쟁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경쟁사들끼리 기능이 같더라도 전혀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으로 동영상 압축 표준 엠펙(MPEG), 5G 이동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위원은 엠펙 표준화 작업에 10년 가까이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5~10년 전만 해도 코덱이 없으면 동영상을 재생하지 못해 골치 아팠는데, 이것도 단일 표준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권위를 가진 표준이 생기고 시장에 도입된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해당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선행 표준화는 기술 개발 촉진하지만, 사장될 위험도 존재"
현재 TC307에서 하고 있는 표준화 작업은 선행 표준화다. 김 위원은 "전통적으로는 업계가 완전히 성숙한 뒤에, 심지어는 시장 지배자까지 튀어나온 다음에 표준이 나왔다"며 "산업 시대의 표준은 신기술이 나오고 규격이 어느 정도 정립된 후,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술이 표준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IT 쪽에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장 형성은커녕 명확한 기술조차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행표준이다.
김 위원은 "예전에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시장이 형성됐고, 사업자가 나오고 최적화된 규격이 나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시장을 노리기 위해 표준화가 요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해당 기술을 안심하고 대중화시켜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 시장을 형성하는 게 선행 표준화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선행 표준화는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시너지가 있다"며 "기술경쟁을 통해 우수한 표준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행 표준화는 위험성이 큰 작업이기도 하다. 표준이 앞서나가는데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을 만들어놨지만 시장 도입이 잘 되지 않으면 그 표준은 사장되기 쉽다.
김 위원은 "실제 선행표준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표준도 굉장히 많다"며 "와이브로도 4G 통신기술 국제 표준 중 하나지만 대세인 LTE에 밀렸다"고 말했다.
즉, 기술 성숙도가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표준 작업은 잘 되면 기술 지형을 닦아 놓는 작업이 되지만, 시장 상황에 빗겨나가면 열심히 작업을 해도 보답받지 못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C307에서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기술 설명서(TS)문서로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 계약의 형태를 연구해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고,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 언어로 해석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블록체인과 IoT가 결합된 미래는 필연이다2019.09.20
- 마크애니, 블록체인 기반 영수증 유통 사업 수주2019.09.20
- "해시타임락 이용해 거래소 없이 코인 교환한다"2019.09.20
-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오류 피하려면 반복검증 필수"2019.09.20
그는 "블록체인은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이고, 저마다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표준화를 쉽게 진행하기 힘든 분야고, 표준이라고 선언해도 그 권위를 쉽게 부정당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며 "섣부르게 국제표준(IS)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TC307에서는 국제표준(IS) 문서로 접근하기보다 기술보고서(TR), 기술설명서(TS)단계의 문서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한 합의된 소스가 잘 없어 주로 특정 플랫폼에서 주장하거나, 소위 '구루(guru)'로 불리는 유명 개발자나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의 발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ISO에서 만드는 이번 문서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나라 전문가가 모여서 합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