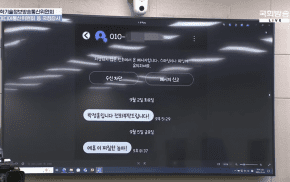구글 플러스가 2일(현지시간) 공식 폐쇄됐다. 2011년 6월 첫 등장한 구글 플러스는 8년을 채 못 채우고 실패한 서비스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막판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폐쇄됐다.
구글 플러스는 소셜 플랫폼계의 ‘금수저’였다. 최고 실력자 구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그 무렵 최고 소셜 플랫폼이던 페이스북을 압도했다. 2010년 매출이 페이스북의 15배에 달했다. 브라우저 시장 후발주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넷스케이프를 몰락시켰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올 정도였다.

■ 화려하게 출발했지만…유튜브 강제 연동 등으로 구설수 올라
구글 플러스의 출발은 ‘금수저 플랫폼’다웠다. 서클을 비롯한 새로운 기능을 대거 추가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2주 만에 이용자 1천만명을 돌파했다. 2011년말에는 9천만명에 달하면서 1억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그 무렵 최고 소셜 플랫폼이던 페이스북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다. 구글 플러스 출범 직후 마크 저커버그가 ‘락다운(Lock Down)’을 선언하면서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던 건 유명한 일화다.
2013년엔 구글 플러스에 동영상 채팅 기능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진 편집 기능도 덧붙였다. 기능 면에선 페이스북보다 선진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서클이나 그룹 기능은 비즈니스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무렵 구글은 또 다른 결단을 내렸다. 구글 플러스를 키우기 위해 자사 서비스와 좀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메일, 유튜브 등과의 결합이었다. 구글 플러스 계정을 통해서만 유튜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략은 결실을 맺는 듯했다. 2013년 10월 구글은 구글 플러스 월간 이용자가 5억4천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 3억명은 지메일, 유튜브와 결합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였다.
구글의 이 같은 전략은 1990년대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번들 전략을 연상케 했다. MS는 끼워팔기 전략을 앞세워 브라우저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둘은 큰 차이가 있었다.‘반독점 행위’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MS의 끼워팔기는 이용자 입장에선 편리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의 통합 전략은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는 그 무렵 구글 플러스를 ‘유령 도시’라고 묘사했다. 5억4천만명에 달하는 월간 이용자 대부분이 구글 플러스를 제대로 방문하지 않는다는 걸 꼬집은 기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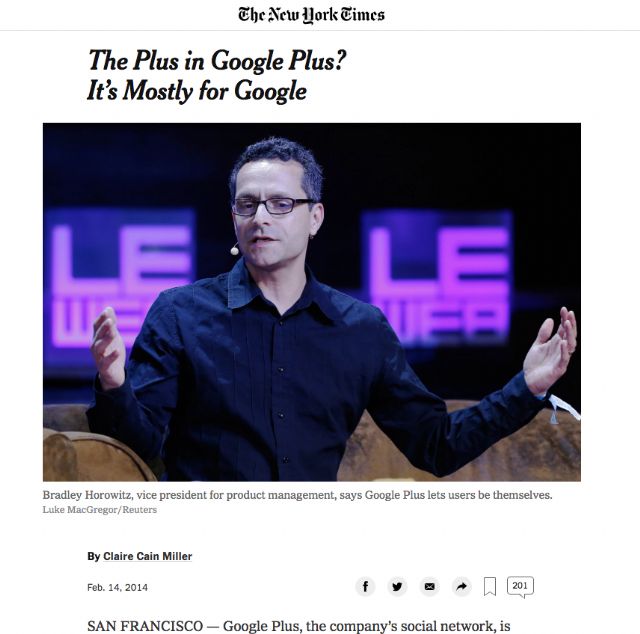
급기야 이듬해인 2014년 4월 구글 플러스를 총괄하던 빅터 군도트라가 전격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구글 플러스를 둘러싼 내부 잡음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 때 이후 구글 플러스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지난 해 구글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구글 플러스 이용자 90%의 평균 접속 시간이 5초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페이스북의 평균 이용 시간은 20분에 이른다.
■ 구글 후광에 안주했던 구글 플러스 vs 절박하게 대비했던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의 실패는 페이스북의 성공과 맞물리면서 여러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금수저’였던 구글 플러스는 구글 후광을 입고 화려하게 출발했다. 지메일, 유튜브 등 인기 서비스들이 구글 플러스 키우기에 동원됐다. 일부 재벌들의 무분별한 2세 지원 전략을 연상케했다.
그 무렵 상대적으로 ‘흙수저’였던 페이스북은 절박했다. 60일 간의 ‘락다운’ 운동을 통해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했다. 이용자 만족을 위한 고민이 계속 이어졌다. 덕분에 ‘받아보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면서 이용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구글 플러스는 기능면에선 페이스북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서클인 행아웃 같은 일부 기능은 오히려 훨씬 더 두드러졌다.
관련기사
- '페북 대항마' 구글플러스, 8년만에 서비스 종료2019.04.03
- 구글이 버린 카드, 구글 플러스2019.04.03
- 영화보다 더 섬찟한 페이스북 '엑스페리먼트'2019.04.03
- 순항하던 페이스북, 이용시간 왜 줄었나2019.04.03
하지만 초기의 무리수와 경영진 이탈, 부정적인 여론 등이 겹치면서 구글 플러스의 영향력은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해말 불거진 데이터 유출 사고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다.
‘금수저 플랫폼’ 구글 플러스의 화려한 출범과 쓸쓸한 몰락은 소셜 전략의 무게 중심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