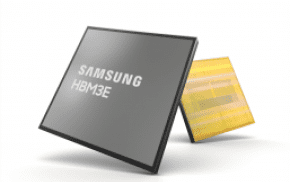노무현정부 시절이니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보통신(ICT) 독임부처인 정보통신부(정통부)가 있던 때다.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통부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 전략’ 행사가 열렸다. ‘SW강국 코리아’를 기치로 내걸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IT코드에서 SW코드로 바꾸겠다”며 SW산업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발주 문화 개선 등 건전한 SW생태계 조성도 약속했다. 예정에 없던 SW에 얽힌 일화도 들려줬다. 당시는 정통부가 ‘ICT 839’라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시기다.
“처음에는 SW가 ICT 839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하드웨어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나중에 SW를 ICT 839에 추가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통부 장관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공개, 좌중을 한바탕 술렁이게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부처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치룬다. SW에 애정이 많았던 노 대통령은 재임중 'SW산업 발전 전략'을 한차례 더 연 것으로 기억한다.
10여년전부터 ‘SW강국 코리아’를 주창했지만 우리나라 SW는 여전히 ‘강국’과 거리가 멀다. SW와 사람(개발자)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지만 SW와 ICT, 과학을 책임지는 미래부 장관은 빠졌다. 사람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전문성과 리더십, 여기에 지역 안배와 '여성 30%' 등 고려할 여러 요소가 있다. 미래부 장관 선임이 늦어지면서 장관이 과학쪽에서 나올지 ICT쪽에서 나올지 호사가들의 입방아도 끊이지 않는다.

굳이 전망한다면 과학쪽보다 ICT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과학 쪽은 이미 청와대에 과학보좌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래부에 신설된 차관급 조직이 과학쪽이라는 것도 장관은 ICT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더한다. ICT와 과학은 특성이 다르다. ICT가 단거리 선수라면 과학은 장거리 선수다. 쓰는 근육이 다른 것이다. 정부는 지원하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성과를 닦달하기 때문에 장거리 보다 단거리 선수가 시선을 받기 일쑤인 것이 우리 문화다.
관련기사
-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해법 왜 못찾는 걸까2017.06.13
- 미래부,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한다2017.06.13
- 찬밥된 SW와 IT2017.06.13
- 새 정부 SW전략, '4저-3불타파'부터2017.06.13
어느 쪽이든 SW와 개발자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직을’ 걸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4차산업혁명의 킹핀이 SW이기 때문이다. 세계 1~5위 시가총액 기업은 다 SW기업이다.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이 진화하면서 SW가 세상을 삼키는 속도가 빨라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SW강국을 이뤄야 4차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의 정국을 보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소신 있고 배짱 두둑한 사람이 미래부 장관이 됐으면 한다.이는 순전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태 때문이다. 시장 원리와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