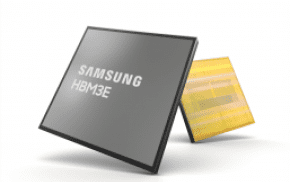삼성SDS는 참 기구한 회사다. 사업 내용도 그렇고 탄생과 소멸 과정으로서의 운명 또한 그러하다. 이 회사는 한 때 한국 IT 산업 특히 한국 SW 산업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하기에 따라 ‘한국의 IBM’이 될 수도 있었고 ‘한국의 오라클이나 SAP’ 나아가 ‘한국의 구글’이 될 수도 있었다.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SW 전문 인력을 그야말로 스폰지처럼 흡수하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사업 분할이 계획되고 있고 분할된 뒤엔 완전히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류 아웃소싱과 IT 서비스로 나뉜 양대 사업부문을 분리한 뒤 관계사와 통합한다는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 회사 측은 통합은 부인하지만 분할 계획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사와 통합하지 않을 거면 분할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SDS는 공중분해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1위 SW 업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자주성의 결여’와 ‘모험심의 부족’이 결정적이다. 이 회사가 설립된 건 지난 1985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기술(IT)이 하나의 산업으로 막 형성되기 시작할 즈음이다. 올해로 사업 영위 32년째인데 이 회사는 그동안 한 번도 성인(成人)으로 살지 못했다.

삼성SDS 사업의 본령은 IT 아웃소싱이다. 삼성 그룹 계열 전산실을 모아 출범했다. 그룹 계열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첫째 사업 목적이다. 그러나 이 회사 출범은 다목적 포석이었다. 무엇보다 IT 아웃소싱이 뜨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졌다. 그룹 차원의 진출 필요성이 컸다는 이야기다. 또 그룹 오너의 후계 지배구도를 완성하는데도 쓸 모가 많은 기업이었다.
삼성SDS가 자칫 해체의 위기에 몰린 까닭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임무의 급박성은 소멸되고 두 번째 임무는 달성하기 요원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 판단을 내린 곳은 그룹의 수뇌부일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 그룹 차원의 전반적인 사업구조 재편과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후계구도 완성 필요성 때문이다.
삼성 그룹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사업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세계 경제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마이너스 금리가 횡행할 만큼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초특급 경쟁력을 가진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게 삼성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전자와 금융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되고 있다. 화학과 방산 계열 회사를 한화 그룹과 롯데 그룹에 매각한 게 대표적이다.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것도 그룹에선 중요한 숙제다. 삼성SDS는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아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로 떠오르면서 삼성SDS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지배구조 말단에 위치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이 지분을 새롭게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
증권 시장에서 삼성SDS의 사업을 분할한 뒤 제3자 매각, 삼성물산 상사 부문과의 합병(물류) 및 삼성전자와의 합병(IT서비스),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다 이와 연관돼 있다. 그룹 지주회사이자 주력 사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오너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향의 시나리오들이다. 다만 복잡한 현안들이 있어 시기는 조금 늦춰질 공산이 크다.
관련기사
- 삼성 사장단 "SDS·물산 합병 검토한 바 없다"2016.06.07
- 삼성SDS 물류 분할…물산과 합병할까2016.06.07
- 삼성SDS "물류 분할 등 사업재편 검토"2016.06.07
- 삼성SDS 물류사업 분할 뒤 어떻게 될까2016.06.07
아쉬운 건 한국 대표 SW 업체인 삼성SDS가 독자적인 역량을 키워 세계적인 SW업체로 변신하는 일을 끝내 볼 수 없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 SW 산업 성장과정에서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삼성SDS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이끌고 삼성 그룹의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적잖은 공을 세운 게 분명하다. 안타까운 건 그 30년 노하우 속에서도 강력한 자생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그룹 의존적 사업구조’가 결정적일 수 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에 비유될 수 있다. 우수한 인력을 통해 급변하는 IT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수용했으면서도 이를 자체 상품화해 고객 외연을 넓히는 데 한계를 보였다. IT 기술로 무장된 종업원 수만 1만4천명에 육박하는 회사다. 사업재편 과정에서도 이들이 쌓은 30년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는 길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