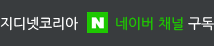“4월,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스마트폰이 13시를 알렸다. 철수는 차가운 시선을 피해 턱을 가슴에 처박고 2분단 셋째 줄 자신의 자리로 재빨리 들어갔다. 커뮤니티를 검색하던 스마트폰 웹페이지가 막을 새도 없이 차단됐다. 차가운 시선이 그 뒤를 따라 들이닥쳤다. 철수의 반은 4층이었다.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계단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CCTV가 그를 노려보았다. CCTV는 교묘하게 붙어져 있었다. 마치 눈동자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래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있는 것처럼.”
2014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나온지 66년이다. 빅브라더니, 감시니 하는 말들은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한다. 언제부턴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첫 키스를 하는 연인들의 설렘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담벼락 CCTV에 기록된다. 아버지의 눈만 피한다고 사생활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몰래 훔쳐보던 관음증의 ‘몰카’는 이제 안전과 훈육을 위한 ‘보험’이 되어 햇살이 환한 대낮의 거리로 나왔다.
범죄를 막기 위해 거리와 건물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이제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도 들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보안관’이란 이름의 학생 스마트폰 제어 앱을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용 학교도 늘었다. 이 앱을 깔게 되면 교사와 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 갔고 앱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공부에 방해되는 쓸데 없는 앱” “음란물같은 유해 앱”을 차단할 수도 있다. 휴대폰의 주인은 아이지만 통제권은 교사와 부모로 넘어간 셈이다.
물론,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동의하는 아이들의 스마트폰에만 해당 앱이 깔린다. ‘강제가 아닌 동의’에 바탕을 했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교사와 부모는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훈육할 의무가 있으니까, 요즘 같이 험한 세상에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스마트폰만 온종일 들여다보는 아이들을 통제해서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분실사고가 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해는 된다.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적절한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시선의 권력은 무섭다. 내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자가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전제만으로 ‘잘못된 행동’은 상당 수 교정되고 예방된다. 미셀 푸코는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한 명의 간수가 수십, 수백 명의 죄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이 시선의 권력에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금 10대는 인류 처음으로 ‘사이버 감시’에 익숙해진 세대가 될지 모른다.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시선은 함께 한다. 언제 잘못을 저지를지 몰라 통제받는 판옵티콘(원형감옥)의 수인처럼 말이다.
2014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외치는 빅브라더는 없다. 대신 자기 검열을 내재화한 또 다른 인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너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로 지켜보는 부모는,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세상의 더러운 정보를 차단시키고 네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스마트폰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언제든 부모와 교사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차단된다. 옮고 그름을 알아서 판단해주는 어른들 아래서 아이의 판단력과 주체성은 흐려지게 마련이다.
관련기사
- 학생 스마트폰 제어 앱 채택 학교 크게 늘어2014.03.18
- 왓츠앱 CEO "사생활 보호, 핵심 DNA"2014.03.18
- 정부 감시 염려없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뿐?2014.03.18
- "페이스북, 사적 메시지 감시" 집단소송2014.03.18
기술 발달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에서 시작해 몸 어느 곳에나 걸치고 정보를 쉽게 찾게 하는 수많은 기기들은 분명히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든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쉼표는 필요한 법이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IT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의 스마트폰 앱 통제가 필요하다면, '음란물'이라 한정된 앱의 차단에 그쳐야 한다. 불법 콘텐츠도 아닌데 부모가 먼저 차단하고, 웹 검색 기록까지 들여다 보는 것은 미성숙한 자녀가 대상이라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조지 오웰은 썼다. “어쩌면 사상경찰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의 선을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도청을 당하고, 캄캄한 때 외에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그런 생활이 본능적인 습관이 되어 버렸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