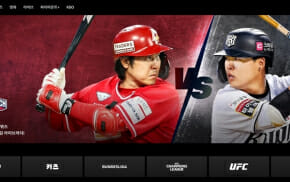‘기술을 공유한다’는 인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한 회사의 내부 기술 지식과 정보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KTH다.
KTH의 개발자 소통 문화는 유명하다.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내부 데이터를 밖으로 아낌없이 공개하고 안으로는 한달에 한 두번 ‘화개금기(화성에서 온 개발자 금성에서 온 기획자)’ 세미나를 열어 내부 단합을 이루는데도 열심이다.
이런 KTH가 오는 31일 개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H3’ 역시 조금 특별하다. 국내외 유명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열을 올리는 다른 기술 컨퍼런스와는 달리 25개 세션 모두 내부 개발자가 강연자로 선다.

행사의 총대를 메고 있는 권정혁 KTH 에반젤리스트·기술전략팀장은 “내부에서 쌓은 기술 지식을 외부 개발자와 공유하고 나아가 함께 크겠다는 것이 H3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부에서의 역량만으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게 권 에반젤리스트의 생각이다.
“발표자 한 사람당 리허설 4번 이상이 기본 원칙이예요. 또 발표자가 리허설할 때는 그날의 모든 발표자가 듣고 의견을 말합니다. 이는 엄청난 시너지를 내죠. 심지어 파워포인트에 들어간 아이콘 하나, 농담을 던질 부분까지도 상의한다니까요.”
권 팀장도 모든 리허설에 참석한다. 이 덕분에 그는 행사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머릿 속에 그리고 있다. 그는 “행사 전날 전체 리허설이 끝나고 나면 세션마다의 감상과 관전 포인트를 적은 글을 개발자 블로그에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청중 유형별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 덕분에 H3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부러움 반 기대 반’이다. 사전 등록을 시작한 지 단 7분 만에 1천명이 넘는 인원이 몰린 것은 인기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참가 신청은 컨퍼런스 주제에 맞게 모바일 웹페이지와 앱으로만 받았던 것도 이색적인 시도로 평가 받았다.
외부의 호응은 물론 내부의 반응도 좋다. 현수막 하나, 폰보드 하나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선 내부 직원들의 손길을 거쳤다. 25개 세션의 발표자들도 모두 직접 손을 든 경우다. 행사를 준비하는 4개월 내내 주말을 반납하고 밤낮을 바꿔야 했어도 즐거워했다.
“지난해 H3가 ‘해피 해킹 히어로’라는 콘셉트를 내걸었다면 올해는 ‘헤비메탈 밴드’로 정했어요. 내부, 외부할 것 없이 모바일 개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신나게 합주를 하겠다는 뜻이죠.” 작년이나 올해나 ‘개발자가 즐거워야 한다’는 KTH만의 신념이 반영된 것은 그대로다.

물론 이번 H3에서 ‘파란 이후 KTH’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파란 사업 접었을 때 다들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은 ‘이제 니네 뭐하니?’였어요. 그 때마다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라고 했죠. 올해 H3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될겁니다.”
KTH는 H3 당일 모바일 개발사의 서버 관련 작업을 쉽게 처리해주는 백엔드 솔루션 ‘바스아이오’를 론칭한다. 지난해까지 ‘아임인’ ‘푸딩투’ 등으로 모바일 B2C 시장에서의 성공을 맛봤다면, 이제 B2B로 눈을 돌려 더 큰 시장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국내 앱 시장, 빈부격차 갈수록 심화2012.10.26
- 하이텔 ‘게제동’을 아시나요?2012.10.26
- 7일 만에 '100만'…'푸딩.투' 인기비결요?2012.10.26
- 개발자가 즐거운 회사 ‘KTH’…왜?2012.10.26
“B2B2C(기업과 기업과의 거래, 기업과 소비자와의 거래를 결합) 기업이 돼야죠. 내부에선 B2D(기업과 개발자의 거래)를 지향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개발자들이 연결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아주 밑단에서부터 앱 개발사들을 지원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플랫폼에서 ‘제 2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포부를 바탕으로 권 팀장은 벌써부터 다음 H3를 생각한다. “내년에는 바스아이오를 활용해 H3 ‘해커톤(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짜는 일종의 개발 마라톤)’을 주기적으로 열고 싶습니다. 개발자들과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