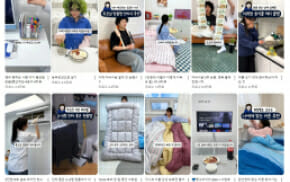“컴퓨터 언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라는 후배들의 질문을 가끔 듣곤 한다. 후배들이 얻고자 하는 답은 대부분 컴퓨터 언어 그 자체에 대한 것이지 개발자로써의 가치나 철학, 비전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이 대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인데…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제 개발자라면 “저는 이런걸 만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선배들에게 자주 던져야 한다고 본다. 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요즘은 개발자들은 행복한 고민 속에 있다. 하고 싶은, 도전해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처럼 개발자들 마음이 싱숭생숭한 때도 드물 것이다. 뭔가 큰 변화가 느껴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써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큰 변화 속에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근 한 달 반 정도 퇴근 후 모교 랩실에 모여 지도 교수님과 동료 박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느꼈다. 바로 “개발자들이 자기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난무하는 유행어들 사이에서 자신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딱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최근 두달여간 정기적으로 과거 박사 과정을 밟았던 모교로 가 아이디어 회의를 해왔다. 주제는 한 마디로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냐? 기술적 사업적 관점에서 랩과 직장을 오가며 각자가 경험했던 각종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 경험을 토대 삼아 미래 중점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모이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주 전공 분야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서버 시스템, 가상화 등 주로 인프라 분야다.
첫 미팅은 빅 데이터 시대의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출발했다. 관련 분야의 해외 벤처기업들의 동향과 시장조사기관들의 리포트에 담긴 내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 덧 두 시간 정도 만에 데이터 분석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첫날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 되면서 다음 과제로 비정형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데이터 검색과 분석에 대해 논의가 결정되었다. 두 번째 미팅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빅 데이터 관련 제품, 기술,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데이터웨어하우스 그리고 하둡(Hadoop)이 중심어로 떠올랐다.
당시 개인적으로 마인드맵을 좀 그려가며 정리를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일단 주제가 어떻게 관계의 꼬리를 물고 가는지 두고 보기로 했다. 하둡에 대한 추이를 각자 알아오기로 하고 다시 마련된 미팅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 덧 서비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다수 하둡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마케팅과 같은 특정 업무 도메인에 기초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서비스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스마트폰이지 않나! 우리의 화제는 애플, SNS,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자연스럽게 외연이 넓어져 갔다. 이쯤되다 보니 결국 회의 주제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넘어 서게 되었다.
서로 전공 분야가 아닌 주제 다루는 가운데 일순간 일종의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둡을 놓고 회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최소한 전문가이거나 팬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진짜 데이터 분석, 하둡과 같은 키워드에 열광하는 이들(Geek)인가 였다. 회의 중간 점점점의 정적이 잦아 지고, 그 간격이 짧아지자 의외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너무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하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된 것이다. “하둡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후 필요성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닐까?“ 바꾸어 말하자면 검색 서비스를 하다 보니, 데이터가 늘고, 처리량도 많아 지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전환은 최근에 유행을 타는 중요한 키워드라 해서 일단 한번 자세히 보자는 식의 접근은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둡의 경우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는 의문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는 일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에서 바라 보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 [칼럼]개발자들 마음 사로잡은 '스포츠 시계'2011.11.08
- [칼럼]오라클 vs 레드햇, 기술지원 서비스 맞붙나2011.11.08
- 삼성부터 현대까지 국내 기업, 앞다퉈 '생성형AI' 영접하다2024.05.05
- 세계 16위 성능 美 슈퍼컴퓨터, 6.5억원에 팔렸다2024.05.05
이런 교감 속에 다음 회의는 좀더 구체적이며,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한달 반 정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매주 2~3시간씩 자유분방하게 토론하며 얻은 깨달음은 최근 몇 년 간 개발자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최근 1~2년 사이 자신이 미쳐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앱 등의 흔히 말하는 뜨는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겠다고 방황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봐왔다. 클라우드, 스마트 등등. 요즘처럼 새로운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고 떠드는 컨퍼런스가 난무하고 커뮤니티 리더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마치 대세인듯 알려질 때일수록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에 귀기울어야 하지 않을까?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