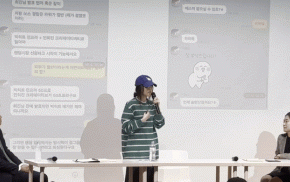뉴욕타임스와 아마존이 ‘비판 기사’ 문제로 제3의 플랫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개월 전 뉴욕타임스가 출고한 기사에 대해 아마존 홍보 책임자가 정면 비판하면서 촉발된 이번 공방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남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방의 불을 지핀 것은 제이 카니 아마존 홍보 및 공보 책임자였다. 카니는 19일(현지 시각) 블로그 플랫폼인 미디엄에 올린 ‘뉴욕타임스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What The New York Times Didn’t Tell You)’란 글을 통해 뉴욕타임스가 지난 8월 내보낸 기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도 3시간 만에 바로 반박 글을 올렸다. 딘 베케이 편집국장이 직접 쓴 반박 글을 통해 아마존이 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 뉴욕타임스, 6개월 취재 뒤 아마존 적나라하게 고발
이번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선 2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월 17일 ’아마존 내부: 가혹한 일터에서 큰 아이디어와 씨름하기(Inside Amazon: Wrestling Big Ideas in a Bruising Workplace)’란 장문의 탐사보도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존 전현직 직원 100여 명을 인터뷰한 그 기사를 통해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이 ‘무자비하고 비인각적인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암 투병 중인 아버지 병구완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못하게 된 여성이 상사로부터 ‘문제 사원’이란 평가를 받고 퇴사한 사례도 소개됐다.
또 쌍둥이를 유산한 한 여성 직원이 수술 다음 날 곧바로 출장을 떠나야 했던 사례도 나와 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는 아마존 사내 곳곳에선 상사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고 우는 직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아마존 사내 문화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것처럼 혹독하다면 나부터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베조스는 특히 “보도된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알려 달라"며 “내게 직접 메일을 보내도 좋다"고 강조했다.
베조스의 해명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두 회사간 공방은 2개월 만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 아마존 홍보 책임자, NYT 정면 비판…NYT 국장, 세 시간 만에 반박
꺼지는 듯했던 불을 다시 지펴 올린 것은 올초 아마존이 홍보 책임자로 영입한 제이 카니다. <타임> 기자 출신인 카니는 아마존에 합류하기 전 한 때 오마바 대통령 대변인으로도 활약했던 중량감 있는 인물이다.
카니는 미디엄에 올린 글에서 “아마존 곳곳에선 책상에 앉아 우는 직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 부분부터 문제 삼았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를 쓸 때 전직 직원인 보 올슨을 인용했다. 하지만 카니는 이 기사 자체가 아마존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전직 직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꼬집었다.
올슨이 고객을 속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인물이란 것. 카니는 또 올슨이 이 같은 부정 증거를 제시하자 순순히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정 행위로 해고된 인물은 인용하면서 그런 사실은 쏙 빼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카니의 비판이다.
아마존 측은 또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6개월 여 동안 취재를 했으면서도 단 한차례도 기명 취재원의 신뢰성에 대해 자신들에게 문의해온 적 없다고 주장했다.

카니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아마존을 취재할 당시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이란 언질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재원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댄 베케이 뉴욕타임스 국장이 곧바로 반박 글을 올렸다. 베케이 국장은 “해당 기사는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수 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전현직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그 기사가 나간 뒤 뉴욕타임스 사이트에는 6천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다”면서 “그 댓글들은 대부분 아마존에서의 경험이 기사에 묘사된 것과 비슷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측이 문제삼았던 기명 취재원 벤 올슨 문제가 다뤘다. 올슨이 아마존 재직 당시 부정을 저지른 적도, 또 자신의 부정을 시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베케이는 “올슨이 부정에 연루됐거나, 그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었다면 기사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댄 베케이 국장은 “문제의 기사는 수 십 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따라서 (아마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 중립지대서 공방…달라진 미디어 지형도 잘 보여줘
양측의 뜨거운 공방에 대해 포천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전 같으면 아마존 측이 뉴욕타임스에 반박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여기에 대해 뉴욕타임스 측이 다시 같은 공간에 반박 글을 올리는 게 그 동안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논쟁에선 중립 지대로 옮겨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는 점이다. 특히 아마존의 공격에 대한 답변 형식이긴 하지만 뉴욕타임스 같은 전통 매체가 미디엄같은 블로그 플랫폼에 기고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포천이 지적했다.
포천은 또 이번 공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한 쪽에선 아마존의 이번 행보가 전형적인 ‘여론 조작(spin-doctoring)’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 인사 파일에나 담겨 있을 내용을 공개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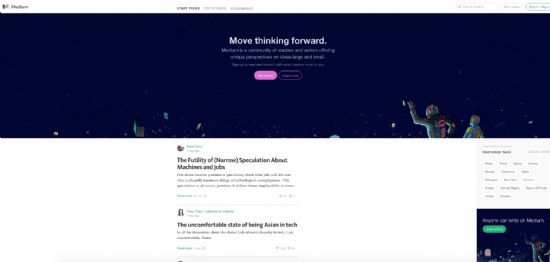
결국 아마존은 이번 공세를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포천이 지적했다.
반면 아마존의 반박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특히 일부 동기가 의심스러운 취재원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충분히 그럴만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포천이 전했다.
관련기사
- '월가 악동'서 미디어 재벌로…헨리 블로짓 '화제'2015.10.20
- 파괴자 아마존…"태블릿이 5만원"2015.10.20
- '아마존 패키지' 워싱턴포스트를 살려낼까2015.10.20
- 페북-애플-구글은 왜 뉴스에 군침 흘릴까2015.10.20
어쨌든 양사의 이번 공방은 내용 못지 않게 싸움을 벌이는 무대 때문에 더 관심을 끌고 있다. ‘모두가 플랫폼’인 시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란 배경을 갖고 있는 아마존이나, 세계 최고 권위지로 명성이 자자한 뉴욕타임스가 ‘계급장 떼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달라진 미디어 지형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