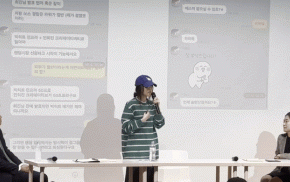기자 초년병 시절, 가끔 보도자료를 썼던 아리수미디어 이건범 전 대표가 쓴 '파산'은 한때 꽤 잘나갔던 회사가 어떻게 쓰러지고 잊혀져 갔는지 지금은 출판 기획자이나 사회 운동가로 변신한 저자 스스로가 고백하는 책이다.
저자는 경영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386 운동권 출신의 기업인이었다. 엄혹했던 시절, 공안사범으로 구속돼 2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다. 출소 후 기업을 통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꿈을 안고 90년대 중반 아리수미디어를 창업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리수미디어는 잘나가는 교육 콘텐츠 SW회사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름 민주적인 운영이 강조되는 기업 문화를 갖추고 연매출 1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묻지마 투자가 횡횡한 벤처 거품이 일기전 일궈낸 성과였다.

그랬던 아리수미디어는 2000년대 중반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건범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자는 책을 통해 파산 후 8년여가 흐른 지금 아리수미디어가 왜 그렇게 됐지는 담담하게 되돌아 본다.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고 기자 역시 공감하는 건 그가 체질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경영자였는데도, 닷컴 버블 속에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경영 전략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아리수미디어는 벌어서 그럭저럭 잘 먹고 사는 회사였다. 그런데 90년대발 벤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매출도 한푼 없는데 거액을 투자받는 유망벤처(?)들이 쏟아졌다.
스스로의 경영 스타일을 고수하던 저자도 달라진 환경과 담을 쌓고 지내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신규 사업을 벌이고, 외부 투자를 받고,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 회사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던 와중에 벤처열풍이 확 꺼져버렸다. 일만 많이 벌여놓은 아리수미디어도 자금난에 휩싸였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외부 투자를 받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의 경영은 아리수의 초심과는 거리가 먼 DNA였다. 결국 저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다.
글에 비친 저자는 사람들을 챙기는 편이다. 파산에 이를때까지 주변인들에게 할바 도리를 다 하려고 했다. 그에게 신용은 은행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망할때 혼자 살겠다고주변을 외면하는 사업가들도 많은데, 저자의 파산 진행 과정은 달랐다. 파트너와 직원들을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파산후에도 은둔자로 지내지 않았다. 만만치 않은 주머니 사정에도 술자리에도 가급적 참석하려고 했다. 파산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크게 신망을 잃지 않았던 것과 저자 스스로의 자의식도 일부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학도 출신인 저자는 책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생각도 거침없이 밝힌다. 창업 열풍이 다시 일면서, 실리콘밸리처럼 실패가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서도 많이 퍼지는 요즘이다. 투자자는 리스크를 지고 창업자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보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다. 보편적 복지의 강화가 창업 활성화와 창조경제의 인프라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갖고 미국식 의료 제도 아래 있었다면 자신은 재기하기 불가능했을거라며 증세를 통한 복지의 강화가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런데도 경영을 했고 지금은 책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저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줘도 좋을듯 싶다. 책에서 저자는 기술 혁신만이 한국의 미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적정 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