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베조스의 품에 안긴 워싱턴포스트의 약진이 놀랍다. 1년 사이에 순방문자 수가 무려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인터연구소 등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의 마틴 배런 편집국장과 샤일라시 프라카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SXSW에서 지난 해 12월 순방문자 수가 4천2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순방문자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1%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공신력있는 조사 기관인 콤스코어 자료를 인용한 것. 따라서 믿을만한 수치라고 봐야 한다.

더 눈에 띄는 점은 이런 성장세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시 콤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의 순방문자 수는 4천8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다.
덕분에 워싱턴포스트는 순방문자 5천950만 명을 기록한 뉴욕타임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버즈피드(8천170만명)에는 여전히 많이 뒤떨어져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뉴욕타임스는 충분히 추격 사정권 내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독자 대신 고객이란 말 사용
물론 이 같은 변화의 밑바탕에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있다. 2013년 8월 개인 돈 2억5천만 달러로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하던 무렵 상황은 최악이었다. 발행 부수와 매출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3년 이후에만 400명 가량이 해고됐다. 여전히 퓰리처상을 받고, 신문도 잘 만들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독일 잡지 슈피겔은 지난 달 워싱턴포스트의 변화를 다룬 기사에서 “베조스는 사주가 된 이후 가장 먼저 편집 간부들에게 변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10, 20년 뒤에도 수 백만 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매체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할 지에 대해 좀 더 크게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 것. 편집 간부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아마존을 성장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워싱턴포스트에 적용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베조스는 “일단 워싱턴포스트가 수 백 만 미국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만 하면 수익은 절로 따라온다”고 믿었다. 초기에 아마존을 키울 때 썼던 방법과 똑 같은 개념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프 베조스가 당장 워싱턴포스트를 변화시킬 마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모든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이뤄졌다.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직후 마틴 배런 국장을 비롯한 편집 간부들이 시애틀에 있는 제프 베조스에게 날아갔다. 그들은 새 사주에게 원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브리핑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베조스와 회동한 마틴 배런 편집국장은 첫 인상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와 논의한 것들은 대부분 다음 질문과 관계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 때부터 마틴 배런 국장도 독자(reader)란 말 대신 고객(customer)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고객 확대란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워싱턴포스트는 ‘베조스 이전’과 ‘베조스 이후’에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택한다.
■ 워싱턴을 넘어 세계로…디지털 전략 강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 12월 제프 베조스가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한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당시 비즈니스인사이더 대표인 헨리 블로짓과 인터뷰에서 “워싱턴포스트는 늘 전국적,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산하는 제품, 즉 기사는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그 동안은 이게 훌륭한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조스는 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수도에 자리잡고 있는 신문이라는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 면서 “그것은 앞으로 전국적, 세계적 출판물이 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베조스 시대’ 이후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슈피겔 표현대로 ‘워싱턴을 위해, 그리고 워싱턴과 함께(‘for and about Washington)’이란 슬로건 하에 인터넷 전략을 뒷전에 뒀던 전임 경영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편집 간부들이 제프 베조스와 만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조치는 ‘모닝 믹스(Morning Mix)’였다. ‘모닝 믹스’는 한 마디로 버즈피드나 허핑턴포스트 같은 사이트들이 다룸직한 기사를 워싱턴포스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었다. 별 것 아니었지만 137년 전통을 자랑하는 워싱턴포스트에선 그 동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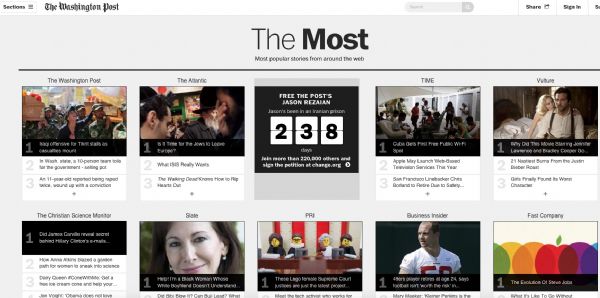
지난 해 5월부터는 견고하게 쌓여 있던 담도 허물었다. 웹 사이트 내에 워싱턴포스트 기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포스트에브리싱(PostEverything)’이란 공간을 마련했다.
그 뿐 아니다. 아예 경쟁사 기사들의 공유 현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도 만들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The Most’에 가면 타임, 살롱, 애틀랜틱을 비롯한 유력 매체의 인기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라인 역시 베조스 시대 워싱턴포스트가 보여준 변화된 디지털 전략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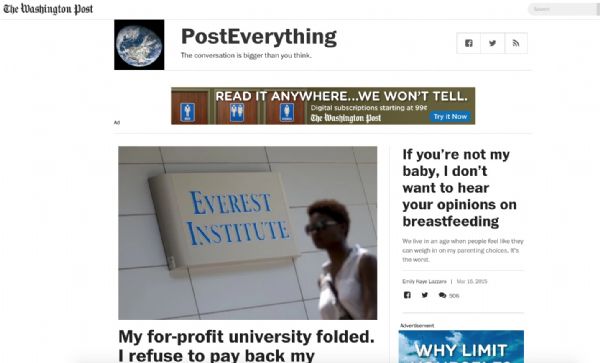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배런 국장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버즈피드처럼 되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언뜻 보기엔 버즈피드를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장점을 워싱턴포스트에 맞게 적용하는 것 뿐이란 설명이다.
■ 지역 신문과 연대 강화 → CMS 판매 등도 눈길
지난 해 3월 출범한 신문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 있는 수 많은 지역신문들과 손잡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개요는 간단하다. 지역신문 독자들은 공짜로 워싱턴포스트 사이트와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초기엔 댈러스 모닝 뉴스, 미네아폴리스 스타 트리뷴 등이 참여했으며, 6개월 여 만에 파트너 신문사는 120여개, 이용 독자 수는 20만 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윈윈 전략의 일환이다. 일단 지역 신문들은 구독 독자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워싱턴포스트의 프리미엄 사이트와 앱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지역 일간지들에겐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워싱턴포스트의 디지털 구독료는 월 9.99달러(웹)와 14.99달러(웹+앱) 두 가지 상품이 있다.
그럼 워싱턴포스트에겐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일단 신규 디지털 구독자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 입장에선 거의 공짜로 수 많은 잠재 독자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잠재 독자들의 이메일과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해 말에는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 언론사를 중심으로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아웃소싱 사업을 시작했다.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을 하는 셈이다.
물론 아직까지 CMS 아웃소싱 사업의 정확한 그림이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자생력 떨어지는 지역 언론사들을 자신들의 우산 아래 모으려는 거대한 야심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CMS 아웃소싱 사업은 추가 매출원 발굴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체 개발할 여력이 없는 수많은 중소 언론사들에겐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트너로 끌어들인 언론사는 콘텐츠 측면에서도 워싱턴포스트란 거대한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전형적인 아마존식 확장전략이라고 볼 수 있단 얘기다.
‘콘텐츠 왕국’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제프 베조스가 앞으로 신문 시장에도 같은 그림을 그리려는 야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단 얘기다.
■ 편집국보다 디지털 인력 쪽에 더 많은 투자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제프 베조스는 워싱턴포스트에 아낌 없는 투자를 했다. 지난 2013년 8월 이후 16개월 동안 편집국 인력만 100명을 신규 채용했다. 덕분에 다른 언론사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편집국 쪽에 60명 가량이 늘어났다.
하지만 베조스가 진짜 공을 들이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기술 관련 투자다. 지난 해 엔지니어만 20명 가량 충원한 것. 덕분에 기술 인력 규모가 225명으로 늘어났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베조스가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주주이기도 한 베조스는 헨리 블로짓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이 전통 신문을 급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발명과 실험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저널리즘의 또 다른 희망 '데이터 분석'2015.03.17
- 로봇 저널리즘, 위기일까 기회일까2015.03.17
- 신문기업 워싱턴포스트, 왜 SW 판매할까?2015.03.17
- IT 저널리즘의 급한 일과 중요한 일2015.03.17
물론 아직까지는 워싱턴포스트의 실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까지 완전히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건 다소 성급하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순방문자 수가 71%나 늘었다는 것은 분명 눈여겨볼 대목이다.
과연 제프 베조스의 ‘워싱턴포스트 헌집 고치기’는 얼마나 더 계속될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언론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안겨줄 수 있을까? 워싱턴포스트의 변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