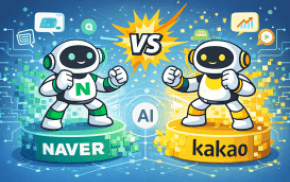IT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무인자동차 주도권을 놓고 경쟁에 돌입했다. 상대 영역의 인재를 영입하고 각자 진영 내에서 합종연횡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 업계는 상대 영역 인재를 영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독일 주요 자동차 부품공급사인 콘티넨탈은 구글의 무인차 개발 책임자였던 세발 오즈를 ‘지능형 운송수단 시스템 개발부서’ 책임자로 영입하고 실리콘밸리에 그를 대표로 하는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씨넷은 콘티넨탈이 2020년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자동차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IT 업계의 대표적인 인재를 영입했다고 전했다.앞서 구글은 포드 전직 최고경영자(CEO)인 앨런 머렐리를 이사회에 영입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에 대한 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인재 영입 경쟁은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무인자동차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IT 기업들과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사이에 인재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세계적으로도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IT 관련 업계와 자동차 관련 업계간 인재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상대 영역의 인재 쟁탈에 열을 올리는 것은 두 분야간 연구 방식이나 교체 주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IT 분야의 경우 모바일의 부상 속에 6개월 미만 단위로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 5~10년 가량의 주기로 기술 변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안전성 등 각종 시험 기준이 다른 점도 상대의 영역에 대한 인재를 탐내는 요인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IT 업계는 자동차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기준만 통과하면 되지만 대신 크기를 줄이거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반대로 자동차는 100% 이상의 안전성을 목표로 하지만 크기나 전력 소모량 부문에서의 압박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오트론을 설립하고 현대엠엔소프트를 인수해 그룹에 편입한 것과,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부인 VC사업부를 새로 추가한 것도 기존 조직으로는 상대 분야의 특성과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구글 출신 책임자를 영입한 콘티넨탈의 헬무트 마치 인테리어사업부 사장은 “지능형 운송수단 시스템은 콘티넨탈에게 여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며 “이것이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우리의 새로운 장소로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카이스트 개발 무인차, 어떻게 움직이나2014.08.20
- 닛산, 무인자동차 로드맵…2020년 상용화2014.08.20
- 美 FBI "무인車, 치명적 무기 될 수도"2014.08.20
- 구글, 포드 前CEO 영입…무인車 질주?2014.08.20
양 업계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인 쌍용자동차가 무인자동차 개발에 뛰어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손잡고 ‘자율주행자동차 공동 개발’에 뛰어든 쌍용자동차는 연구원 측과 인적 교류,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에 합의했다. 이 밖에 콘티넨탈은 물론 닛산도 2020년까지 무인차 상용화를 외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구글을 중심으로 한 무인자동차 개발 연합체인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OAA)'에는 구글과 엔비디아, LG전자, 프리스케일 등 IT 업체들과 GM, 볼보, 벤틀리, 폭스바겐, 아우디, 닛산 등 완성차 업체가 참여해 협력과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양 업계가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