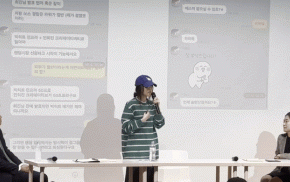장사를 하면서 “밑지고 판다”는 말은 없다. 기본료를 포함한 약정과 각종 복잡한 할인 제도, 고가의 단말기값이 혼합된 스마트폰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손해 보는 휴대폰 장사가 대형 유통망에서 종종 발생한다.
지난 주 보조금에 웃돈을 더 얹어 최신형 스마트폰을 마이너스폰으로 둔갑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대형 유통망의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생기는 경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할당량을 채워야 수익이 나오는 계약 관계 속에서 자본력을 내세운 대형 유통망이 자체 보조금을 실을 때 나타난다. 열 개 팔아야 수익금을 주는데 하나를 못팔아 하나는 덤으로 준 것과 같은 논리다.
별도 사옥을 가진 중소기업 규모의 대형 유통망이나 일부 대기업 유통망에서는 하위 대리점과 판매점에 통신사 보조금 정책과 자체 보조금 금액을 하달한다. 이때 일정 수량 이상을 팔아야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볼륨 정책이 떴다”라는 표현이 쓰인다.

■ 자본력의 승리...손해 보더라도 월 할당량 채워 메꾼다
단계별 유통망 사이에서도 할당 가입자 증가 수량이 있다. 스마트폰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자 유치도 할당받은 수만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나오는 것이 볼륨정책이다. 예컨대 한 대리점이 최소한 1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채워야 건당 5만원의 수익을 윗선 유통망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90명까지 채운 뒤 나머지 10명을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 손해를 보면서 100명을 채운다는 뜻이다. 열명의 가입자에 대해선 손해를 봤지만, 전체 100명의 가입자를 계산하면 이득이다.
이런 상황은 주로 월말에 일어나곤 한다. 지난주 보조금 과열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 마이너스 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할당량이 대개 월별 기준이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이들은 자체 유통망을 통한 가입자가 적게는 1만~3만명대, 많게는 10만명대에 이른다. 월별로 통신사에 영업 할당 금액으로 3천원 가량을 받는다. 3만명이라고 치면 월간 9천만~1억원의 이익이 있다는 뜻이다. 이 돈을 사업 확장을 위한 자체 보조금에 싣게 된다.
■대형 유통망의 과열 경쟁, 이통시장 멍든다
스마트폰 보조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사와 통신사는 단말 원가와 마진을 고려해 마케팅 비용을 조절한다. 이 비용은 수시로 변한다. 중소 판매인들은 “보조금 규제 사각 시기에 판매 정책으로 둔갑시켜 월 100회 이상의 정책 홍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에 따른 판매 가격 결정권이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중소 판매점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싸게 팔아 실적도 못올리고 대형 유통망보다 비싸게 판다는 질책만 받는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측은 “이동통신 업종은 고유 업종이 아니라 일반 업종으로 분류됐는데 이번 하이마트 사태를 볼 때 재벌 유통망의 이통시장 진입은 소상공인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시장 혼란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한다.
통신사도 가끔은 골칫거리로 여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를 직접 받는 것은 유통망이 아니라 통신사”라면서 “우리가 집행한 보조금을 보다 많아서 시장 과열을 일으킨다며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열린 점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매우 드문 사례라 혜택을 입는 소비자가 거의 없고, 이동통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통신업계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다들 “왜곡된 이통 시장이 나중엔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기사
- 휴대폰 보조금 제재, 얼마나 독해질까2013.11.06
- 스마트폰 보조금, 왜 항상 17만원일까2013.11.06
- 휴대폰 개통 지방서 하면 '보조금 대박?'2013.11.06
- 휴대폰 보조금 제재, 제조사로 이어질까2013.11.06
완벽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서 논의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로선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차별을 줄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스마트폰 출고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스마트폰 값이 비싸지 않았으면 보조금의 차이가 크지도 않았을테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이유인 소비자 차별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며 “기계값이 싸면 약정 할인 형태도 줄어들어 오히려 통신비도 낮추는 경쟁을 하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