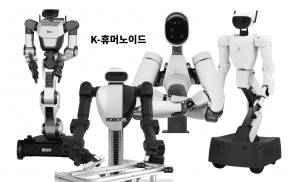카카오 게임하기가 일년을 맞았다. 카카오는 애니팡 신화를 시작으로 드래곤플라이트, 윈드러너, 다함께 차차차, 모두의 마블까지 1천만 다운로드 게임을 줄줄이 배출하며 모바일 게임업계 제1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눈부신 성과에 쏟아진 찬사만큼 아쉬움의 목소리도 컸다. 모바일 게임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운 공은 크나 수익금 배분, 입점 게임 선발 기준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글로벌 진출엔 번번이 실패하며 '국내용' 아니냐는 한계도 지적받았다. 1주년을 맞아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시선을 살폈다.<편집자 주>
<상>카카오게임 벌써 일년…빛과 그림자
<하>카카오, '글로벌 벽'에 부딪히다
흔히 '골리앗을 쓰러트린 다윗'에 비견됐다. 애플도 구글도 아닌데, '메신저' 하나만 키운 신생 기업이 이동통신사를 제끼고 국내 제일의 게임 플랫폼으로 컸다. 슈퍼 갑 이동통신사를 무너뜨린 울트라 슈퍼 갑. 내로라 하는 게임 퍼블리셔들도 눈치를 보는 곳, 바로 카카오톡이다.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이 오는 30일로 탄생 한돌을 맞는다. 지난 1년간 1천만 다운로드 게임을 다섯개나 배출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 게임 플랫폼이다.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은 카톡 게임을 해봤다는 이야기다. 카톡의 무서운 점은 게임을 한 번도 안해봤던 사람까지 '하트'를 주고 받게 한 힘에 있다.
그만큼 카카오 게임하기에 쏟아진 관심은 컸다. 하루가 멀다하고 카카오 게임에 관련한 기사가 나왔다. 카카오는 그만큼 많은 게임을 배출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적게는 서넛에서 많게는 일곱개의 게임이 'for kakao'를 달고 이용자들과 만났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이 카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불문의 공식마저 나온 상황이다.
■카카오, 그 먹음직스러운 과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성적이다. 지난 16일 카카오가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제휴 게임사들의 카카오 게임 총 판매액은 3천480억원으로, 1천182억원을 달성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94%나 증가했다. 게임 플랫폼 누적 가입자 수도 3억명을 돌파했다.
초기 마케팅 효과도 톡톡했다. 개발사들의 공통된 고민은 내 게임을 어떻게 홍보하느냐다. 존재부터 알려야 하는데, 광할한 구글·애플 마켓에 게임 하나 띄워놓고 발만 동동구르기 일쑤였다. 그런데 카톡이 등장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이어주는 일종의 채널링 서비스인데, 카톡 이용자들이 이게 뭐지라며 쉽게 다운로드를 받았다.
게다가 획기적이었다. 대형 퍼블리셔와 손잡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하나로 예비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넥스트플로어도 드래곤플라이트를 성공시키며 하루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게임 시장을 키운 공은 크다. 1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8개 게임 중 절반이 중소 개발사에서 나왔다. 다수 모바일 게임 히트작을 탄생시키며, 카카오는 규모에 상관 없이 콘텐츠가 우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카카오 측에선 자사 게임 플랫폼이 게임을 대중적인 문화로 정착시켰다고 평가한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게임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며 게임 이용자 층 저변을 넓혔다는 뜻이다. 여기에 게임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확산 시켰다는 점도 순기능으로 꼽는다.
반승환 카카오 게임사업본부장은 내가 아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카카오 게임 특유의 재미요소가 기존 게임을 즐겨하지 않던 이용자에게까지 소구 포인트로 작용했다며 올 하반기 중소 개발사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소셜 기능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영광 뒤에 가려진 그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났다. 카톡의 최대 효과인 '마케팅'이 빛이 바랬다. 너무 많은 게임이 쏟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카톡에 입점이라는 산을 넘으니, 걔중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또 다른 산이 등장했다. 한때의 영광을 쫒던 카톡 게임들은 출시 당일에 튀지 않으면 일주일만에 사라지고 마는 서글픈 운명을 맞았다.
게다가 올 상반기엔 대형 게임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CJ E&M 넷마블이 퍼블리싱한 '다함께 차차차' 이후, 히트를 친 게임들은 대부분 대형 퍼블리싱이 주도한 것이다. 온라인에 강점을 가졌던 개발사와 퍼블리셔들이 카톡 게임에 대거 진출하면서 중소 개발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 개발사들의 고민은 다시 시작됐다. 카톡에 넣어도 안 팔리는 게임들이 늘어났다. 울며 겨자먹기로 카톡에 입점한다는 게임들도 생겨났다. 일부는 과감히 카톡을 포기했다. '양으로 승부'란 관행도 생겨났다. 장기적 관점보단, 트렌드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임을 수십개씩 뿌리는, 하나는 걸리겠지란 전략이다.
관련기사
- 숫자로 풀어본 '카카오 게임 1주년'2013.07.29
- [게임테크]카카오가 예측한 하반기 인기 게임은?2013.07.29
- 카카오톡 가입자 1억명 돌파2013.07.29
- 카카오 김범수의 직장인 힐링 프로젝트2013.07.29
카톡이 가져가는 30% 수수료가 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글에 30%, 카카오에 30%를 떼어주고 나면 개발사에 돌아오는 몫이 적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앞서 이를 지적하지는 못했다. 지난 한 달간 만난 모바일 게임업체 사람들은 카카오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꺼내기 전, 항상 우리 카카오와 친해요, 실명이 나가면 곤란해져요를 단서로 달았다.
그럼에도 카톡 외엔 대안이 없다.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위상이 이정도다. 누군가는 카톡으로 이득을 봤고, 누군가는 '카톡 드림'만 쫒았다. 1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이 줄을 이었으나, 모두 '한국'이란 장벽을 뛰어넘진 못했다. 모바일 게임 시장 꽃을 피운 카톡에, 그만큼 아쉬운 시선이 공존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