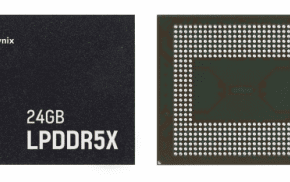중세 유럽의 라인강은 신성로마제국의 보호를 받던 무역항로였다. 하지만 13세기부터 그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됐다. 봉건귀족들이 너도나도 성을 세우면서 저마다 제멋대로 불법 통행 요금을 걷었기 때문이다. 귀족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자 선박들은 아예 통행을 멈췄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 무역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나아가 유럽 경제성장의 파이를 줄어들게 했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10일 구글개방성포럼 강연에서 미국 콜럼비아대 법학교수 마이클 헬러의 라인강 예화를 인용, 저작물 시장에 빗댔다. 라인강의 비극이 바로 저작권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임 정책관이 말하는 현재의 저작물 시장의 위기는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는 저작권의 배타적·독점적 성격이고 두 번째는 저작자의 등록과는 상관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 마지막은 라인강의 세워진 성처럼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반공유지의 비극’이다.

결국 저작권자를 모르거나 혹은 이미 권리자가 포기한 자원도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자원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정체상태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임 정책관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문제로 좌절된 대표적 사례가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구글북스는 세계 모든 도서관의 책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에 담아내려는 구글의 야심찬 계획 하에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인류가 그 동안 펴낸 단행본은 약 1억3천만권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구글북스에는 3천만권 가량이 올라와 있다.
그는 “구글북스는 권리자가 이미 포기한 자원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창출을 낼 수 있고 이용자가 정보접근성의 혁신적 신장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출판되는 책의 약 3%만이 점자나 소리책 등 대체포맷으로 제작되는데 반해 구글북스는 음성과 점자를 모두 지원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구글북스는 임 정책관 말대로 저작권 문제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다. 자체 디지털 도서관 컨소시엄을 구축한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구글 북스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구글은 몇해 전부터 알빈 미셸, 프라마리온, 갈리마드 등 프랑스의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최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프랑스 작가협회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6년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사 출판사와 작가들은 구글이 스캔한 문학작품들의 판매를 허용하고 구글은 수익금을 작가와 출판사와 나누기로 했다.
관련기사
- 국내 출시 초읽기...넥서스7 기대되는 이유2012.07.11
- 애플고객 정보 빼낸 구글...사상최고 벌금 망신2012.07.11
- 애플 iOS6 자체 지도 앱, 맥PC에도 투입?2012.07.11
- 구글 동성애 합법화 캠페인…파장 예상2012.07.11

구글측은 이번 합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빛이 바랄 뻔한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변호사는 “구글북스가 답보상태에 빠졌으나 구글은 이를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관도 “구글이 서비스 주체로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구글북스와 같은 시도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된다”면서 “저작물 시장에서도 비록 라인강 운하처럼 여러 권리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합의처럼) 한번에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이 장치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