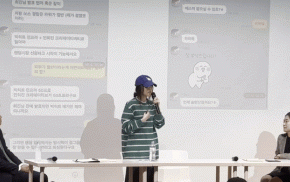얼마전 끝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엔 잊힐 권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왔다. 강요한이란 국회의원이 대학시절 한 시위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다.
극중 설정이 참 공감이 됐다. 그 사진엔 자신의 첫 사랑과 지금의 아내가 함께 나와 있었다. 강 의원의 대학시절 첫 사랑은 그 시위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
강 의원이 유명해진 뒤 그 사진이 거론될 때마다 아내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의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중병에 걸리자 그 사진 때문에 늘 마음이 걸렸던 강 의원은 아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극중에서 강 의원이 소송을 건 이유가 마음에 와 닿았다. “잊힐 권리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잊을 의무에 관한 것이다.”

철 지난 드라마 생각을 하게 된 건 며칠 전에 있었던 어떤 독자와의 통화 때문이다. 전화를 걸어온 그 독자는 본인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2000년대 초반 모 업체 대표로 발령난 내용이었다.
아무리봐도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었다. “별 내용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력이다. 이력서에도 안 쓴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력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그런데 구글에서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이력이 자꾸 뜨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사정은 딱했다. 하지만 마땅히 삭제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에겐 그 기록도 소중한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곡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기사를 삭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기사는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지울 근거가 없다.” 그러자 그 분은 “그 사이트에 남아 있는 건 역사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구글 검색은 안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글에 문의해보시라”고 했다. “전화했더니 기사를 쓴 지디넷에 문의해보라고 하더라”는 답이 돌아왔다.
■ 기록성과 잊힐 권리, 그 접점은 어디일까
그 대목에서 ‘미스 함부라비’에 나왔던 에피소드 생각이 났다.
물론 둘은 사정이 한참 다르다. 개인적으론 ‘미스 함무라비’ 에피소드에 좀 더 공감이 됐다. 독자분과 통화할 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회사 대표로 잠깐 있었던 게 그리도 잊고 싶은 기억일까”란 생각이 살짝 들었다.
하지만 그런 정도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련한 옛 일이 야속할 정도로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불편하긴 매한가지일 것이다.
관련기사
- 인터넷 '잊힐 권리' 시행...내가 쓴 글 지우려면?2018.08.13
- 한국판 잊힐 권리 시행...지식인-상품평도 포함2018.08.13
- 한국판 ‘잊힐 권리’ 졸속 처리 '논란'2018.08.13
- 잊힐 권리만큼 중요한 '잊히지 않을 각오'2018.08.13
굳이 따지자면 ‘기록성’과 ‘잊힐 권리’의 충돌 쯤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두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늘 기록성 쪽에 무게를 더 두게 된다.
그런데 절절한 독자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잊힐 권리’ 혹은 ‘잊을 의무’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그 둘의 균형점은 어디쯤일까? 해답 없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