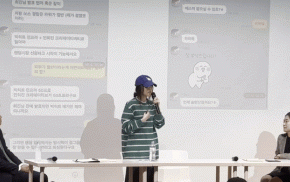182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엄청나게 혼탁했다. 민주당 후보 앤드류 잭슨과 공화당의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유례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언론들은 온갖 추문들을 쏟아냈다. 애덤스가 러시아 짜르에게 미국인 소녀를 ‘상납’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잭슨을 둘러싼 추문도 만만치 않았다. 언론들은 잭슨의 어머니가 노예와 동침했다는 의혹을 전해줬다. 아예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이런 추측성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애덤스의 미국인 소녀 상납설은 잭슨 측이, 잭슨 어머니의 노예 동침설은 애덤스 측이 퍼뜨린 ‘가짜뉴스’였다. 이 루머들이 언론을 타고 ‘뉴스’로 변신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불을 뿜고 있다. 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가짜뉴스 파문이 한국에까지 넘어왔다. 특히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가짜뉴스가 더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선 아예 ‘가짜뉴스 추방운동’이 시작됐다. 진원지로 꼽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앞장섰다. 언론사들과 손잡고 가짜뉴스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갑자기 가짜뉴스가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 해 벌어진 충격적인 두 사건 때문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다.
두 사건은 ’포스트 트루스(post truth)’란 신조어까지 탄생시킬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또 이슈가 된 건 그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짜뉴스가 주목을 받는 사정도 비슷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맞아 근거 없는 온갖 소문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럴듯하게 신문이나 인터넷뉴스로 포장한 기사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 유통비용-청중확보-법규 등 세 가지 장벽 무너져
물론 가짜뉴스가 최근 들어 새롭게 부상한 현상은 아니다. 18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9세기에도 가짜뉴스는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그 뿐 아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두 차례 세계전쟁 때는 ‘가짜뉴스’로 상대방을 현혹하는 선전(propaganda) 활동은 일상적인 작전으로 통했다.
물론 19세기 이전 가짜뉴스와 요즘의 가짜뉴스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예전의 가짜뉴스는 국가기관이나 정부 같은 대형 기관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가짜뉴스는 개인들이 무차별 유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차이를 알면 “왜 갑자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까?”란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잘 분석했다.
텔레그라프는 유통망과 비용, 청중과 신뢰 획득, 그리고 법과 규정 등 세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관련기사] What is fake news? It's origin and how it grew in 2016?)

그 동안 국가 같은 거대기구가 아니면 가짜뉴스를 대량 유통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설사 만들더라도 유통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뿐 아니다. 가짜뉴스에 관심을 기울일 청중을 확보하고, 그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신뢰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출판물을 통해 ’엉터리 정보’를 수시로 유포할 경우엔 곧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 세가지 장벽이 모두 무너졌다.
이젠 개인 차원에서도 그럴듯한 뉴스를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도달 범위와 정보소통 모든 면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아닌 한 제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더 큰 요인은 불확실한 정세…탈진실이어 가짜뉴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된 지 10년 가량 됐다. 그런데 그 동안은 왜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시대적 상황’이란 또 다른 변인이 필요하다. 지난 해 영국,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탈진실’을 의미하는 포스트-트루스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근래 보기 힘들 정도의 혼란 속에 빠졌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다.
지난 해부터 ’가짜뉴스’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는 건 이런 시대적 상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소셜플랫폼이 결합되면서 진실과 거짓이 마구 섞인 ‘포스트-트루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은 가짜뉴스 추방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세계 유력 언론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짜 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요즘처럼 개인들도 그럴듯한 정보를 대량 유통할 수 있는 시대엔, 진짜와 가짜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평판시스템이나 필터링시스템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관련기사
- 구글-페이스북 "가짜뉴스 원천봉쇄"2017.02.09
- 美 대선 강타한 가짜뉴스, 한국은 괜찮을까2017.02.09
- 사람들은 ‘가짜 뉴스’ 진짜 믿었을까2017.02.09
- "페북 가짜뉴스 추방"…SW개발자들 나섰다2017.02.09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포스트-트루스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유언비어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뜨거운 단어로 떠오른 가짜뉴스 얘기를 접하면서 국내외 상황이 더 불편해졌다. 지난 해 ’탈진실’(post-truth)’에 이어 올해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올해의 단어’가 될 수도 있겠단 불안감 때문이다. 그 불안감이 작용한 걸까? 오늘따라 날씨도 더 차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