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기사에서 우리 사장님 사진 좀 빼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꽤 오래 전 어떤 업체 홍보 담당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곧바로 해당 기사를 검색해봤다.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되물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꼭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본인께서 원하신다”는 답이 돌아왔다. “곤란하다”고 했더니, “몇년 된 기사인데 사진 좀 빼는 게 뭐 대수냐?”고 따졌다. “그것도 역사다. 게다가 사진을 빼버리면 기사 꼴이 이상해진다”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끊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 무렵 무슨 횡령 혐의로 구설수로 올랐다는 내용이 검색됐다. 그런데 두 기사가 나란히 뜨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 얼굴이 노출됐다. 상받은 기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왜 그토록 빼고 싶어하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다.
■ 빠른 전파속도-과잉 맥락화로 인한 피해
요즘 ‘잊힐 권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심코 올린 글이나 사진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 본인이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주자는 게 골자다.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가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EU의 잊힐 권리는 ‘게시글 삭제’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검색되지 않을 권리’다. 구글 검색에 걸리지 않을 경우 예전 기사나 글은 사실상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난 ‘잊힐 권리’는 ‘과잉 맥락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과잉맥락화’란 말이 생소한가? 그렇다면 몇 년전 이슈가 됐던 모 연예인 얘길 떠올리면 된다. 당시 그 연예인은 아들의 열애 해프닝 때문에 케케묵은 ‘사건’이 이슈로 떠올라 한동안 구설수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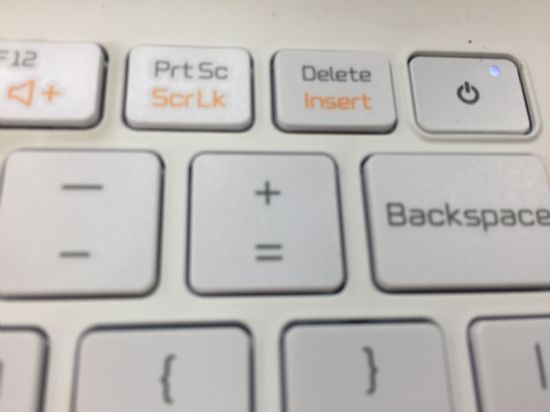
물론 잊힐 권리는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쓴 글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때 좋은 감정을 유지했다가 헤어질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예전 같으면 둘이 간직했을 사진들이 버젓이 디지털 공간을 떠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꼭 부적절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잊히지 않는 과거 때문에 불편하긴 매한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SNS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버리는 시대에 적절하게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 줄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난 ‘잊힐 권리’ 못지 않게 ‘잊히지 않을 각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 새해엔 매사를 '잊히질 않을 각오'로 했으면
디지털 공간에선 자기 의견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손에 스피커 하나씩 들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자기 얘기를 남들에게 하기 쉬워졌단 얘기다.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중을 향해 말하는 게 쉬워지면서 온갖 소음들이 넘치기 시작한 탓이다. ‘잊힐 권리’의 대상이 될 것들 중엔 그런 것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목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마디. 난 그런 소음들이 나쁘단 얘길 하려는 게 아니다. 웬만하면 입을 꾹 닫고 있으란 얘기도 절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절대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그래선 난 디지털 시대엔 ‘잊힐 권리’ 못지 않게 ‘잊히지 않을 각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딘가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한번쯤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다. 예전엔 그저 몇 명이 들었을, 설사 그 사람들이 주변에 퍼뜨리더라도 한 단계 거쳤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을 내용들이 무차별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일들이 참 많았던 2015년도 이젠 딱 이틀 남았다. 다들 ’병신년’이란 불편한 이름의 새해맞기가 두렵다는 말들도 많이 한다. 주변 상황들이 뭣 하나 유쾌한 게 없어서일 게다.
이런 상황에서 ‘잊히지 않을 각오’란 화두를 내던지는 게 조금 뜬금 없어 보이긴 한다. 하지만 세상만사는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하루 하루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거대한 변화의 돌풍이 몰려오는 게 인생사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또 좌절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계속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일 게다.
새해엔 ‘잊히지 않을 각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개인도 그렇고, 위정자도 그렇고. 나중에라도 지워버리고 싶을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각오. 그래서 기록된 걸 좀 바꾸거나 지워버리고 싶단 유혹을 아예 받지 않도록 살겠다는 각오. 이렇게 쓰고보니 개인 못지 않게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
관련기사
- 페북 어쩌나…EU "개인정보 관리 관행 조사"2015.12.30
- EU "美와 정보공유 금지"…구글-페북 등 비상2015.12.30
- 웹 창시자 "EU 잊힐 권리 규정, 위험하다"2015.12.30
- EU, 이번엔 '잊힐 권리'로 구글 압박2015.12.30
(사족)
다 읽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결국 그 사장 분 사진을 지워주진 않았다. 다시 전화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다. 혹시 전화가 왔더라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 받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권리를 누렸으니, 이 부분도 감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고 답하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