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한 주부가 있었다. 꼼꼼한 그는 시장 볼 때마다 충실하게 가계부에 기록했다. 콩나물 하나, 두부 한 모 빠뜨리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가계부를 적었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그냥 좀 더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정부에선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자료가 없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가늠할 잣대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정부 관계자가 우연한 기회에 이 주부 얘길 듣게 됐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10년치 신문을 뒤져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거시경제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도 없는 한 주부가 매일 매일 기록한 가계부는 그 무렵 한국 소비자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 1970년대 어느 주부와 데이터 저널리즘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다. 물론 저 얘기의 사실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흔히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떠올린다. 당연한 얘기지만, 탐사보도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보도나 국정원 트윗 분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조세피난처 분석 보도는 훌륭한 데이터 저널리즘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국의 저널리즘 지형은 그만큼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가 쉬운 건 아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게다가 특정 주제를 몇날 며칠 붙들고 있을 정도로 유연한 취재시스템도 필수 요소다. 하루 하루 마감에 급급한 기자들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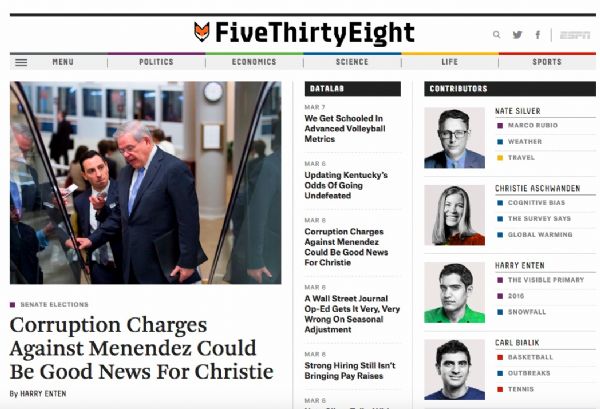
규모가 작은 언론사들은 더더욱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하루 하루 쏟아져들어오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늘 뭔가에 쫓기게 된다. 게다가 방대한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들을 보면 절로 주눅이 든다. 뉴욕타임스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가 아니면 도무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 것처럼 보인다. ’스노우폴’을 보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포기하는 것과 똑 같은 심정에 빠지기 쉽다.
물론 꼭 데이터 저널리즘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독자들에게 ‘공적인 의무’를 다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데이터 분석’이 우리 시대 저널리즘에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젠 웬만한 PC에는 다 깔려 있는 엑셀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일 흔하게 접하는 데이터에서 의미 찾을 수 있다면?
앞에서 소개한 주부 사례는 ‘가난한 언론사’ 기자들에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곰곰히 따져보자. 출입처나 관련 기관들에서 쏟아져나오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꼼꼼하게 갈무리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흩어져 있을 땐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데이터들이라도, 한 데 잘 모아놓으면 의미 있는 ‘트렌드’를 읽어내는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데이터를 꼭 기자 개인의 스토리지에 쌓아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자료가 모여 있는 사이트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말이 대중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웹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란 사실도 흥미롭다. '데이터 저널리즘-스토리텔링의 과학'에 보면 팀 버너스 리가 지난 2010년 데이터 분석이 저널리즘의 미래라고 언급하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말이 급속하게 확산됐다고 한다.
특히 지난 해부터 데이터 저널리즘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뉴욕타임스가 ‘업샷’이란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사이트를 선보인 데 이어 워싱턴포스트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또 뉴욕타임스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던 네이트 실버는 아예 파이브서티에이트닷컴 (FiveThirtyEight.com)을 독립 사이트로 출범시켰다. 복스 미디어 역시 지난 해 4월 일반 뉴스 사이트인 복스닷컴(Vox.com)을 선보였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난 데이터 분석이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팀 버너스 리의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발생 속보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엔 ‘쏟아져나오는 데이터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관련기사
- 유튜브 10년…저널리즘은 어떻게 달라졌나2015.03.08
- 로봇 저널리즘, 위기일까 기회일까2015.03.08
- IT 저널리즘의 급한 일과 중요한 일2015.03.08
- 구글 뉴스 폐쇄와 '링크 저널리즘'의 종말2015.03.08
그래서 나도 1970년대 어느 주부의 심정으로 작은 데이터부터 하나 하나 정리해보려 한다. 그게 의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진 나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더미 데이터’로 그냥 흐지부지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데이터를 특화해서 정리하는 작업은 소박한 차원의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믿기에,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보려 한다. 독자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