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법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현상을 볼 때 그건 맞는 진단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럴 줄 모르고 이 법을 만들었다면 큰 시행착오이겠으나 사실 그건 이 법이 의도한 바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경쟁 촉진보다 완화가 목적이었다는 뜻이다.
일부 소비자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정부를 ‘빨갱이’라고 욕한다. 자유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또한 꼭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플랫폼은 아니다. 모순과 갈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하고 관리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만약 시장이 절대 완벽한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세금을 내 정부를 둘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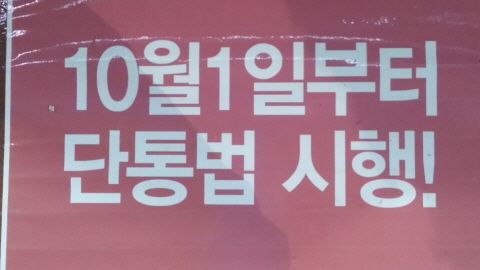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빨갱이’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기도 하다. ‘빚내서 집 사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서 보듯 지금 이 정부는 나중에야 어찌됐든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버릴 태세다. 그런 정부가 규제를 통한 경쟁 완화를 고민했다면 한번쯤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제의 본질부터 따져보자. ‘가계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차별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지금 우리 숙제다. 길은 정 반대의 두 가지다. 경쟁 촉진과 경쟁 완화. 이중 정부는 후자를 택했다. 그 이유부터 다시 생각하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건전한 것이었다면 경제 일반론으로 볼 때 전자(前者)가 더 나은 해법이다. 기업 사이의 경쟁이 심할수록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간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이동통신 시장은 이 ‘경쟁 일반론’이 먹히지 않는 구조다. 경쟁이 되레 통신비를 올려왔다. 왜 그런 것일까.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기업 사이의 담합이 용이하고 ‘비본원적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동통신 서비스 3사 사이에서는 요금에 대한 암묵적 담합이 성행한다. 후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요금 인가제가 3사의 요금 담합을 위한 법적 토대가 돼왔다는 것은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는 바다. 서비스 3사가 단말기 유통을 전담하면서 오랫동안 제조업체와 출고가 담합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 또한 대부분이 아는 상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과징금을 통해 징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담합이 자연스럽다보니 경쟁 구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품질과 요금 경쟁을, 제조사는 단말기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은 이런 경쟁을 해본 적이 없다. 특히 서비스 요금은 3사가 늘 비슷비슷하게 오르내리고 단말 가격도 다 엇비슷하다. 유일한 경쟁 수단은 딱 한 가지다. 보조금. ‘전가의 보도’처럼 오로지 ‘보조금 경쟁’만이 시장을 지배한다.
그 결과 우리 이동통신 시장은 ‘높은 가계통신비’와 ‘소비자 차별’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는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보조금을 써야 하고 그러다보니 높은 통신요금을 집중 판매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가 보조금을 써 고가 단말을 팔아주니 제조사는 단말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다. 비싼 단말기에 유혹된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요금에 가입하는 관행을 되풀이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과 보조금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미시적 방법.
전자(前者)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금제’다. 서비스 회사가 단말기까지 공급하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서비스 회사의 단말 판매를 금지시켜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단말은 단말끼리 ‘본원적 경쟁’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 경우라면 기업 사이의 경쟁 활성화가 가격을 내리는 경제 일반이론이 통할 것이고 가계통신비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제도의 문제는 유통 장악력을 잃어야 하는 서비스 회사, 유통 비용을 새롭게 떠안아야 하는 제조사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 현재 약 15만여 명이 종사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상당수가 급격한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구조조정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초강력 해결책인 만큼 따라올 반대급부 또한 엄청 큰 셈이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부가 쓰는 방법이 그래서 미시적 규제다. 단통법 또한 그 하나다. 보조금을 규제해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그 비용을 줄여 이를 기반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불법 보조금은 엄단하면서, 합법적인 보조금은 사전에 공시토록 해 소비자 차별까지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시장이 위축되면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법을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과거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된 일부 소비자다. ‘대란’ 상황에서 단말 가격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일부 소비자에게 단통법은 심각한 악법인 셈이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한다. 이를 테면 보조금 자율화, 즉 보조금 완전 경쟁을 의미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동통신 서비스 3사와 제조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사실 이것이다. 왜? 그게 가장 이득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를 원하면서도 주장하지 못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 폐해를 너무 잘 아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까닭이다. 대통령이 공약까지 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다수가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 적당히 높은 가계통신비와 어느 정도의 소비자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책 또한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소비자들이 다시 아우성칠 게 뻔하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동통신 서비스 3사가 유통을 완전 장악하고 보조금이 유일한 경쟁수단인 현재 시장 구조 아래에서 경쟁 촉진은 가계 통신비를 높이고 경쟁 완화는 이를 내리는 쪽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 단통법 개정안 4건 비교해보니…2014.11.17
- 단통법 진정국면?…요금할인 속속 민심 주목2014.11.17
- 정교하게 설계된 단통법이 확 꼬인 이유2014.11.17
- “호갱님 들어봤냐”…단통법 성토장 된 국회2014.11.17
분명한 사실 하나 더. 빨갱이라고까지 욕먹는 정부가 경쟁 완화로 얻으려는 건 가계통신비 인하지 기업 돕자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기업들만 도와주자면 일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보조금 완전경쟁이 훨씬 더 낫다는 기막힌 현실.
우리 모두는 지금 집단적 착시 현상에 빠져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